본문영역
|
11월은 쓸쓸하다. '1'의 간격을 더 띄어 써보면 스산함이 훅 풍긴다. 나뭇잎 다 떨군 나목들의 빈 가지처럼 허전하다. 무언가 빠져나간 헛헛함이 내 안에 지긋이 눌러둔 결핍을 깨운다. 없는 것들이 더 드러나는 11월의 기분이다.
결핍은 함의가 각별한 말이다. 특히 문학에서는 결핍을 하나의 양식으로 삼아온 지 오래다. 있어야 할 게 빠지거나 모자라는 결핍의 상태가 갈망을 더 키우는 까닭이다. 무엇이든 없으면 더 간절해지는 법, 결핍을 동력 삼은 자가발전이 무릇 예술에 깊이를 더하고 아름다움을 더해온 것이다. 많은 작품이 극심한 결핍 속에서 피워낸 걸작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아보는 일은 흔했으니 말이다.
문학에서만 봐도 결핍의 힘은 자주 운위됐다. 이와 관련해 많이 인용한 구양수의 유명한 어록이 있다. "시가 궁해진 뒤에 더 좋아진다. 시가 능히 사람을 궁하게 한다(詩窮而後工 詩能窮人)"는 것. 과연 시라는 것은 그러한가. 이에 대한 설왕설래를 접어놓고 다시 보면 절묘한 함축이요 되새길 문장이다. 하고 보면 시인들이 대체로 궁하긴 하다. 궁한 뒤에 시가 더 좋아지든, 시가 사람을 궁하게 하든, '궁끼'란 빼놓을 수 없는 시의 무엇 같다.
그런데 그런 지경마저 양식 삼는 시는 대체 언제 오는가. 한동안 시인을 밤새워 쓰는 올빼미족으로 보는 선입견이 많았다. 밤새워 쓴다는 말도 이제는 민망한 상투어가 됐듯, 시인이라고 다 밤을 새워 쓰는 것은 아니다. 밤에 시가 더 잘 써져서, 밀린 원고가 너무 많아서, 마감이 닥쳐서, 등등의 이유로 밤새워 쓰는 시인은 많을 것이다. 하지만 시인도 생활인이니 언제나 밤새워 쓴다는 것은 어려운 노릇이다. 시의 신 뮤즈나 시적 영감이 특별히 강림하는 밤이라면 또 모를까.
그럼에도 시는 '궁'의 어느 지점에서 치고 들어오는 듯하다. 뭔가 고프거나 아프거나 슬프거나 외롭거나 괴롭거나, 그런 격랑이 오래 일고질 때. 세상에 치이며 힘든 영혼이든 감정이든, 마음을 종잡기 어려울 때. 그렇듯 궁한 심정일 때 시가 더 치고 오는 것 같기는 하다. 나날이 벌어지는 세상의 숱한 일과 문제 속이나, 변함없이 나고 자라 피우고 열매 맺는 자연의 소임에 시적 궁리를 대보기도 한다. 그러는 중에도 더 좋은 시를 얻으려 구걸할 때가 많으니, 시란 역시 충만보다 결핍의 촉발이라고 끄덕인다.
시를 써놓고 뭔가 부족해서 더 구하는 것도 궁한 상태라 할 수 있다. 정신적 허기처럼 시적 미흡도 결핍이니 궁한 모습인 것이다. 물론 현실적 궁핍이 삶을 더 옥죄고 실제로 어려운 처지의 시인이 많다. 그래선지 요즘은 시인들이 적은 원고료도 다 받는다고 한다. 전에는 구독료로 돌리는 시인이 많아 문예지 발간에 도움이 됐는데 지금은 다른 것이다. 적은 고료(시 1편 3만원 같은)라도 받는 권리 인식이 바뀐 데다 시인들의 어려운 주머니 사정도 있는 것이다. 본래 전업이 불가능한 게 시업(詩業)이라지만, 결핍은 여러 면에서 점점 커질 듯하다.
결국 시란 만성 결핍의 운명일까. 현 작품에 만족 못하는 뭇 예술(인)의 숙명처럼. 궁한 삶보다 앎의 허기를 더 두려워하는 인문정신의 여정처럼. 그래서 새로운 것을 찾고 그리며 나아가는 길 위에 다시 서는 것이겠다. 결핍마저 동력 삼을 때 자기 갱신의 양식이 된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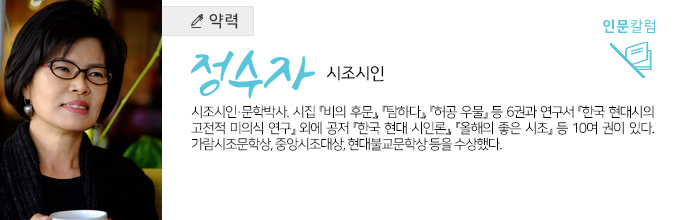
|
독자의견전체 0개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 '더 쉽고 즐거운 자원봉사' 수원 청년이 나선다
- [구운동] "건강하게 식사하세요!"
- [조원2동] 아이, 부모, 운전자까지 모두 안심되는 등굣길!
- [평동] 반석중앙교회, 바자회 수익금 기부
- 장안구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 프로그램 '인지를 꽃 피우다' 운영
- [우만1동] 주민자치회, 마을자치 계획 수립 지원사업 3차 워크숍 개최
- [우만1동] 주민자치회, 봄맞이 공유냉장고에 든든한 반찬 후원
- [원천동] 복합적 위기 해결을 위한 3차 통합사례회의 개최
- [정자2동] 통장협의회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호신술 교육 추진
- [권선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 24년 첫 '나누미 키트' 전달
 즐겨찾기 추가
즐겨찾기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