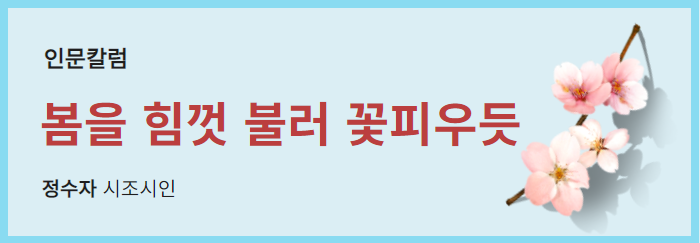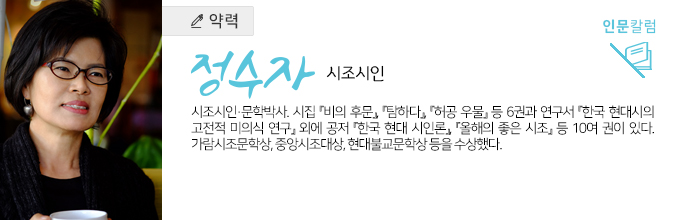본문영역
|
봄은 우리 곁에 조금 더 오고 있다. 아직 추울 날이 있고 눈도 더러 치겠지만 봄의 입김이 도처에 닿는 듯하다. 그렇게 자꾸 불러야 봄도 번쩍 눈을 뜨고 달려올지 모른다. 숨죽이고 겨울을 넘어온 땅이며 나무며 얼음장 밑 냇물이 불러내야 눈곱 낀 겨울잠을 떨칠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믿으면 설레는 마음들 모아 우리의 봄을 힘껏 불러야 하리라.
실은 봄이 늘 쉽게 오진 않는다. 겨울 끝은 길어서 꽝꽝 언 강과 개울과 길이 다 풀릴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흔히 대동강 물이 풀린다는 우수 지나고 경칩까지 지나야 봄이 완연해지곤 한다. 자연의 일이 그러할진대, 설 지나고 바로 입춘이라니 너무 이르다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일찍 닥친 입춘을 보내며 얼른 일어나 봄맞이 잘하라는 독촉장이나 봄편지 쯤으로 여기며 덩달아 분주해진다.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어디 뻘밭 구석이거나 썩은 물 웅덩이 같은 데를 기웃거리다가 한눈 좀 팔고, 싸움도 한 판 하고, 지쳐 나자빠져 있다가 다급한 사연 들고 달려간 바람이 흔들어 깨우면 눈 부비며 너는 더디게 온다. 더디게 더디게 마침내 올 것이 온다. 너를 보면 눈부셔 일어나 맞이할 수가 없다. 입을 열어 외치지만 소리는 굳어 나는 아무것도 미리 알릴 수가 없다. 가까스로 두 팔을 벌려 껴안아 보는 너,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
그런 설렘과 기다림과 희망을 잘 보여주는 이성부의 「봄」. 이 시는 봄을 기다리고 부르는 것이 곧 우리네 사람살이에 희망을 펼쳐내는 일임을 일깨운다. 그것은 온갖 훼방 속에서 아주 더디게 오더라도 우리 곁으로 기어이 오는 봄 거리에서 다사로운 햇볕을 같이 쬐는 일이다. 더불어 힘을 내며 곳곳에서 뒤꿈치 들고 들썩이는 갖은 싹들을 일으켜 세우는 울력이다. 그렇게 다가오는 새봄을 잘 맞으라고 조상들은 아직 추운 겨울 끝자락에 입춘을 매화 꽃잎처럼 올려놓았으리라.
입춘대길 건양다경(立春大吉 建陽多慶, 봄이 시작되니 크게 길하고 경사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길 기원한다). 문전마다 봄을 부르고 맞이하고 새로 지어가는 세시풍속이 눈이 남은 길목을 훤하게 한다. 다치고 지친 마음들도 풀어주는 환한 햇살들이 서로 손을 잡고 우리 곁에 선다. 일찍이 마련한 정조의 '호호부실 인인화락(戶戶富實人人和樂)' 정신도 그와 다르지 않은 수원지역의 큰 그림이고 너볏한 꿈이겠다.
새롭게 출범하는 수원특례시. 더 큰 수원을 위한 큰 정책도 좋지만, 낮고 후미진 곳을 고루 살피는 살뜰한 갖춤도 필요하다. 인인화락의 정신을 살리면 봄도 더 봄답게 가꿔낼 것이다. 지금 이곳의 나날이 더 푸른 노래로 거듭날 수 있도록.
|
독자의견전체 0개
많이 본 뉴스
- [현장르포] "집수리 막막한가요? 새빛하우스 컨설팅 전문가가 찾아갑니다"
- 뭐라도학교, 유쾌한 8시간 워크숍
- "어르신들에게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이다"
- 수원 청개구리 기자단 오리엔테이션 성황리 개최
- 119년만에 돌아온 수원 화성행궁 우화관(于華館)과 별주(別廚)
- 꿈꾸는 기타리스트 정성하의 토크콘서트 !
- "고객 서비스는 머리로 하면 두통, 마음으로 하면 소통"
- 매주 토요일은 '재미샵' 가는 날, 플라스틱 모아 지역화폐로 교환해요!
- 서화, 수채화, 글쓰기로서 100세 장수 시대를 선도하는 명인
- 다채로운 끼와 재능을 가진 청소년들, 모여라!
 즐겨찾기 추가
즐겨찾기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