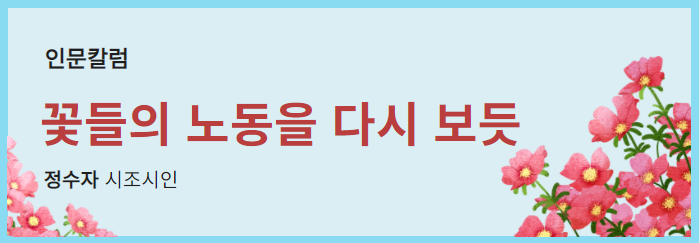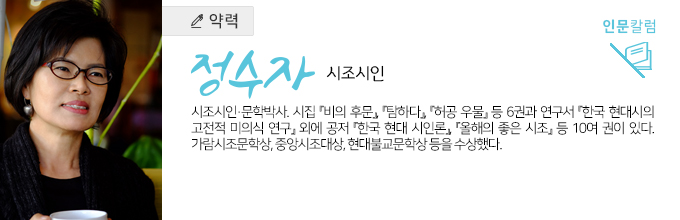본문영역
|
꽃은 시샘을 많이 받는다. 꽃샘바람이라는 예쁜 이름도 시샘에서 나왔다. 꽃 한 송이가 피는 데도 많은 시간과 시샘의 시련을 거치는 것이다. 햇볕, 온도 같은 자연의 기운을 불어넣어도 느닷없이 닥치는 꽃샘추위를 잘 이겨내야 각자의 이름을 피우는 게다.
꽃샘추위, 꽃샘바람은 물론 사람들의 명명이다. 얼핏 예쁘게 들리지만 그 이름에도 시샘이라는 인간사가 들어있다. 봄 입구의 변화 많은 날씨에 세상사 감정을 붙여놓으니 이름과 뜻이 더 또렷해지는 느낌이다. 봄이 오고 꽃이 피는 것이 다 스스로 그러한 자연의 일. 하지만 그 모든 게 쉽게 오는 것만은 아니었으니 시련 극복의 의미가 새삼 짚이는 것이다. 그만큼 이겨내야 할 시기나 질투 같은 게 많은 세상사가 명명에서도 읽힌다.
꽃샘추위는 우리네 품으로 더 파고든다. 곧 봄이라는 심리에 더 차가운 살바람을 느끼나 싶지만, 실제로 이른 봄의 추위도 매섭다. 복수초나 매화 같은 봄꽃들이 눈 속에서 피어나는 소식이 닿아도 살을 파고드는 꽃샘바람에 아직은 더 떨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월에 물독 터진다'는 속담도 봄 문전의 반짝 추위를 실감나게 전해온 말이다. 우수까지 지나도 깜짝 추위가 닥치며 사람이며 산천초목을 떨게 했으니, 오래 전부터 반복해온 자연의 일이 그러하다.
꽃샘이 치고 가도 도처의 꽃들이 저를 피우느라 바쁠 것이다. 제 소임을 하고 가려고 곳곳에 저의 짧은 생을 펼쳐낼 것이다. 그렇듯 시련 속에 피는 게 꽃만 아니건만, 모든 탄생의 경이로움인 양 우리는 개화를 찬양해왔다. 꽃이라는 아름다움의 정수에 우주의 신비까지 깃들여 드높여 왔다. 학문과 예술은 물론 정신이나 사물의 최고나 사람의 아름다움도 꽃에 빗대어 왔다. 최고 아름다움에 얹어온 꽃이라는 은유의 관(冠). 그만큼 아름답고 향기롭고 눈부시기로 꽃을 넘어설 게 없긴 하다.
그런데 꽃도 실은 씨앗을 낳기 위한 하나의 기관이다. 무화과 같은 예외를 제외하면, 모든 꽃이 생식의 역할을 감당하니 겉과 다른 속의 중요한 소임이 있다. 그러고 보면, 잘 피어난 꽃들 앞에서 향기롭다고 코를 들이밀거나 예쁘다고 카메라 들이대는 행위 등은 얼마나 제멋대로 즐김인가. 벌 나비가 찾아와 그들의 일을 하고 자신의 일을 마치기까지 갖은 애를 쓰는 꽃들의 노동 앞에서 말이다. 더 좋은 생식을 위해 최대한 피어나는 꽃을 그저 구경하며 즐겨왔으니, 이제는 그 노동 앞에 서면 꽃들의 소임을 경건히 들어볼 일이다.
그렇듯 달리 보고 전하는 눈을 만나면 반갑다. 인문적 시선도 그렇고 시인의 시각도 다른 면을 읽어내는 힘이 크니 말이다. 꽃이 피기까지의 과정에 더 기울이고 살펴보는 많은 시편처럼. 그런 시와 글이 있어 우리는 일상의 습관적 자세나 관점을 뒤집어보기도 한다. 우리의 삶도 꽃이 피고 지는 일과 다르지 않은 과정의 연속이니 그와 함께 읽어낼 것들도 더 짚인다. 이 또한 인문적 성찰을 깨우는 시의 서늘한 힘이자 위안과 치유를 건네는 시의 다사한 품이겠다. 그런 마음을 켜들고 봄이면 회자되는 시(도종환, 「흔들리며 피는 꽃」)를 다시 깊이 읽는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
 즐겨찾기 추가
즐겨찾기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