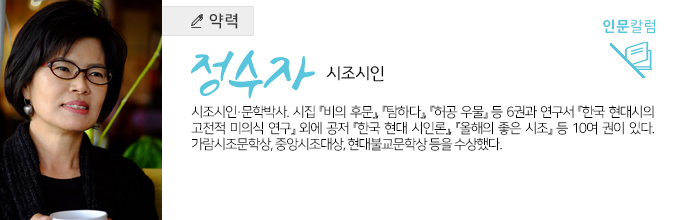본문영역
|
묻는 편인가. 듣는 편인가. '> <'에 따라 삶의 태도가 드러나는 말이다. 말하기/듣기와는 조금 다른 차원이 개입되는 셈이다. 물론 어느 경우든 '무엇' 혹은 '어떻게' 같은 구체적인 자세와 관련이 있겠지만.
둘러보면 우리 사회는 질문을 조심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묻기 자체를 불편해하는 경우가 많은 듯하다. 질문을 하거나 받거나 입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묻기를 꺼려하는 사람도 많다. 날카로운 질문이 아니라 또는 좋은 질문을 찾다 기회 놓치는 사람도 있겠다. 그래서 결국엔 질문도 알아야 하고 학습이 돼야 잘하지, 주입식 교육 탓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말없이 듣기가 어느 면에서는 편하다. 태어나기 전부터 듣기를 해왔으니 말이다. 하지만 우리는 듣기·말하기·읽기·쓰기를 거치며 한 인간으로 성숙한다. 말과 글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때 비로소 하나의 주체로 올곧게 서게 된다. 그런 과정을 통해 말/글은 한 인간으로서의 삶의 자세며 세계관의 토대를 이룬다. 말/글이 곧 그 사람이고 인격이라는 오래된 전언 앞에 자주 옷깃을 여미게 되는 까닭이다.
돌아보면 잘 묻던 때도 있었다. 아무거나 물어도 통하던 어린 시절이 그랬다. 아기는 어디서 나와요? 꽃은 어떻게 피나요? 나무는 왜 서서 자요? 등등. 모르는 것만큼 많은 호기심으로 무조건 물어도 좋았던 것이다. 그럴 때 어른들이 질문을 잘 받아줬으면 이후에도 묻기를 즐겼을지 모른다. 하교하면 오늘 무슨 질문을 했느냐고 묻는 유대인 부모같이 했다면 날마다 새로운 질문을 터뜨렸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질문이 왜 줄었을까. 무엇보다 주변의 눈치가 작용한다. 잘못 물으면 망신당하기 딱 좋은 분위기니 차라리 침묵이 편했던 것이다. 게다가 질문 자체를 거부하는 교사나 어른도 많아서 서서히 입을 닫는 쪽으로 굳었다. 생뚱맞은 질문이나 엉뚱한 답 같은 상상 밖의 것들은 책 속에나 존재하는 시절을 지나온 것이다. 그렇게 진짜 질문은 꿍쳐둔 채 어른사회로 진입하니 질문하는 방법조차 잊고 사는 게 아닌지.
묻기를 피하거나 두려워하는 사회. 어쩌다 그리됐는지, 대학 강의실에서마저 질문이 없다는 개탄이 반복되고 있다. 질문 없는 사회의 흑역사는 오바마 전 미대통령 방문(2014년) 때 질문 못한 기자들 표정으로 지금도 회자된다. 한국기자를 콕 집어 질문권을 줬는데 침묵만 지키는 약1분간의 틈을 타서 중국기자가 나섰으니 나라 망신이라고 혀를 찼다. (언론)고시로 입사한 내로라하는 기자들이고, 질문이야말로 기자의 일이 아니던가.
그래서 불치하문(不恥下問)을 다시 본다. 나이나 지식이나 낮은 사람에게 묻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니, 공자의 태도와 인식을 집약한 말이다. 이렇듯 학문도 묻는 데서 시작되니 잘 물어야 잘 익히는 게 당연하겠다. 문답법으로 유명한 소크라테스만 아니라, 열린 사람은 불치하문의 자세로 닫힌 사람보다 앞서 나아갈 힘을 얻는다. 학문의 근간인 인문학도 질문에서 비롯되고, 그에 따른 답을 찾아가며 더 풍요로워지는 것이겠다.
묻는 것은 무릇 시작이다. 다시 봄의 출발이고, 새로 씀의 첫걸음이다. 문학도 학문처럼 물으며 길을 열었듯, 묻기에 따라 쓰기가 달라진다. 하여 잘 묻기와 잘 듣기로 나아가면 인문정신의 실현도 넓어질 것이다. 문(問)과 문(聞), 새삼 짚어보는 인문의 길이다.
|
 즐겨찾기 추가
즐겨찾기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