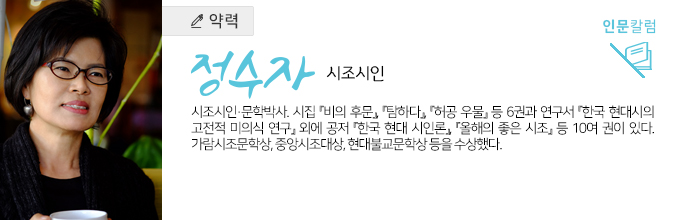본문영역
|
귀는 듣는 게 업이다. 업(業)은 먹고살기 위해 하는 일. 세상의 밥벌이니 고단하다. 그런 업을 수행하는 동안 귀는 늘 열려 있다. 나날의 삶을 지탱하기 위해 여일하게 열린 채 열일을 하는 것이다.
실제로 닫힌 귀를 본 적이 없다. 잠긴 귀도 들은 바 없다. 의지대로 여닫을 수 없는 운명을 띠고 나온 것이다. 마음껏 여닫지 못하기는 코도 같지만, 귀는 둘이라 더 힘들지 싶다. 그런 귀에 대해 전해오는 비유나 함의를 보면 소임도 퍽 무겁다. 특히 깨달음의 비유가 크게 닿는데, 경청이며 소통의 가늠에도 써온 것을 보니 귀의 영역은 참으로 넓고 깊다.
한 예로 여시아문(如是我聞)이 있다. 일찍이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아난다가 부처의 가르침을 사실 그대로 전한다는 의미)로 일러온 이 한마디는 많은 것을 일깨운다. 다양한 의미를 깨우칠 뿐 아니라 전언의 방식도 새록새록 숙여보게 한다. 어떤 가르침이든 '그대로' 전하는 겸허와 존중이 특히 그렇다. 자기 식의 왜곡과 편집을 일삼는 요즘의 '전하기' 실상에서는 더 돌아볼 죽비다.
실은 사건·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만도 쉽지는 않다. 똑같은 복사 자체도 어렵지만, 기억의 자동편집이라는 예기치 않은 끼어듦이 종종 발생하는 까닭이다. 우리가 자주 경험하듯, 두 명이 같은 상황을 겪고 그 일을 그대로 복기하려 해도 말이나 행동 등 조금씩 다른 세부적 차이가 나온다. 그래서 '여시아문' 같은 자세가 더 묵직하게 치는 것이겠다.
'여시아문'은 문학에서도 중요한 마음가짐이다. 모든 감각을 최대한 열어놓는 작동 중에도 귀 기울이기는 더 길게 유념할 자세다. 그런 점에서 문학의 귀는 클수록 좋겠다. 사람살이 일만 아니라 바람의 말이며 나무의 노래, 벌레의 움직임 등등 귀담을 것 천지인 까닭이다. 크고 너른 귀를 지녀야 쓰려는 것들의 귀띔도 더 담을 수 있다. 문학을 때로 받아 적기로 보는 것도 그런 데서 나오는 그대로 옮김의 존중이다.
그와 달리 귀를 씻는다는 말도 크게 닿는다. 거슬리는 말도 걸러낼 수 없는 게 귀의 입장. 나쁜 말이든 욕이든 뱉는 말은 듣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 거슬리는 말을 듣는 순간 귀를 씻는 게 최선인 게다. 물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는 말도 있지만 귀를 씻는 것과는 다르다. 무엇이든 가려들을 수 없는 귀의 처지에서 보면 실로 애꿎고 고독한 노릇이다.
귀는 우리의 좌우를 지킨다. 세상의 좌/우는 늘 시끄럽지만,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고들 한다. 하지만 귀에는 딱히 좌우의 역할이 부여되지 않은 듯하다. 다만 어느 쪽이 더 잘 들린다든지, 방향이나 청력에 따른 차이는 나온다. 그리고 귀를 기울이는 정도에 따라 듣는 것의 질이나 양이 현저히 달라진다.
늘 열려 있는 귀. 그래선지 숨을 놓는 순간까지 귀는 듣는다고 한다. 어머니가 마지막 눈을 감으실 때 엎드려 죄를 고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귀밑의 힘이었다. 아무튼 지쳤을 때 눈 딱 감고 쉬듯 잠시 휴업조차 할 수 없는 귀야말로 고단하기 짝이 없을 것이다. 밤에도 뭔 소리들은 계속되고 열린 귀로 마구 튀어들 테니 말이다.
새길수록 귀의 수행이 더없는 덕행이다. 세상이 시끄럽다면 정성껏 씻기부터 할 일이다. 그러다 보면 여시아문 같은 두루 경청도 더 경이롭게 만날 것이다. 잘 씻고 잘 거르되, 나직이 깊이 듣다 보면 귀도 더 넓어질 테니.
|
독자의견전체 0개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 수원시 중소기업, 체코·네덜란드에서 수출 개척
- 수원시, '2024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 '수원시 공동관' 참가업체 모집
- 매주 토요일은 '재미샵' 가는 날, 플라스틱 모아 지역화폐로 교환해요!
- "어르신들에게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이다"
- "생활에서 지구를 구하는 탄소중립을 배워요!"
- [영화동] 99세까지 팔팔(88)하게 '9988 건강복지상자' 배부
- 율전초등학교, 책과 함께 하는 신나는 놀이마당 도서관 축제 진행
- 영일초등학교 "식품 알레르기로부터 안전해져요!"
- 수원시 지역자활센터 우수생산품 한 자리에 모였다
- 수원 청개구리 기자단 오리엔테이션 성황리 개최
 즐겨찾기 추가
즐겨찾기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