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
그늘에 숙이는 나날이다. 연일 끓여 붓는 불볕 아래 서면 작은 그늘에도 절로 숙여진다. 가로수 좋은 길이면 너른 잎들이 불화살을 가려주어 웅숭깊은 나무 덕을 되새기게 한다. 그래 고마운 마음으로 올려보면 나무마다 축 늘어진 잎사귀를 끄덕이며 새 바람을 넌지시 보낸다.
폭염 속 그늘막도 그늘의 역할을 잘 보여준다. 그늘의 힘에 주목한 살핌이 뙤약볕에 잠시나마 쉼 그늘을 만든 것이다. 특히 더 뜨거운 횡단보도 앞마다 펼쳐놓은 그늘막에 사람들이 들어서면 새로운 풍경이 연출된다. 도심의 인위적 그늘막이 시골의 늠름한 정자나무처럼 그늘의 품을 빚어내는 것이다.
한낮에는 한 뼘 그늘도 크게 닿는다. 점심 길이거나 업무 길이거나, 손바닥만 한 그늘을 찾아 걷는 사람들이 그늘의 힘을 여실히 보여준다. 커피를 든 채 건물들 사이 작은 그늘을 골라 딛는 모습들이 마치 처마에 기댄 새떼 같다. 겨울이면 뼛속 시린 빌딩그늘도 여름 땡볕에는 얼굴 가리며 뛰어드는 사람들에게 가로수 같은 그늘을 펼쳐주는 것이다.
때와 곳에 따라 명암이 다른 그늘. 그러고 보니 그늘이야말로 비유의 층위가 다양하다. 예컨대 부모그늘이라면 요즘 운위되는 '수저론'과 닿으니 대를 잇는 덕이다. 부모그늘 잘 탔는데 형제그늘까지 좋다면 일생 넉넉한 가계그늘을 누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그늘보다 큰 그늘은 자신이 가꿔가는 삶의 그늘이다. 큰사람을 그늘이 넓다고들 말하듯, 삶 자체가 깊고 너른 그늘을 이루는 사람도 꽤 있으니 말이다.
그와 달리 유리벽 같은 차별의 그늘도 있다. 흔히 그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고 규정하는 경우들이 그렇다. 어두운 사연이 느껴지는 인상에 갖다 붙이던 그늘 운운은 대부분 부정적인 측면의 부각이다. 그런 사람일수록 구조적으로 야기되는 사회적 그늘에 대한 선입견도 덧입히기 쉽다. 그늘 어린 인상을 피하거나 편 가르기 기준에 넣어 습관적인 차별을 가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늘에 깊이를 부여하는 시각도 있다.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사랑하지 않는다"(정호승, 「내가 사랑하는 사람」 부분)는 구절은 사람과 그늘을 보는 눈이 얼마나 다른지 일깨운다. 물론 시인은 여기서 더 나아가 "나는 한 그루의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고 폭을 넓히지만. 그럼에도 그늘의 이면을 확 깨는 선언으로 시의 여운이 정자그늘처럼 푸르다.
보통 그늘 없는 사람이 밝고 건전하다고들 선호한다. 그런 관습적 시선보다 그늘 속에 짚이는 삶의 곡절을 오히려 눈여겨보는 다면적 인식도 있다. 그늘이 있어야 깊이도 있고, 그래서 남다른 그늘의 문양을 거느릴 수 있다고. 일상에서 그런 그늘을 돌아본다면, 단순치 않은 그늘의 겹과 깊이를 두루 볼 줄 아는 겹눈의 소유자겠다. 바닥을 알아야 거기서 솟아나오는 힘을 읽어내듯.
그늘에 기대어 그늘을 본다. 바람이 더 머무는 느티나무 그늘이 보잘 것 없는 내 그늘을 일깨운다. 그늘 편에 더 선다는 문학의 길에 들었지만, 어떤 그늘이 되고 있는가. 또한 어떤 그늘을 꿈꾸며 더불어 노래하듯 가꿔갈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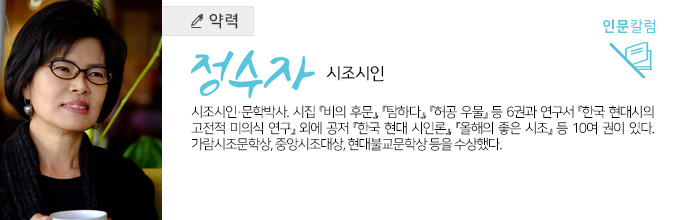
|
독자의견전체 0개
많이 본 뉴스
- 재미난 밭에서 시작하는 재미난 '황톳길 산림치유 프로그램'
- 관심 집중된 수원시립합창단의 아주 특별한 기획연주회 관람기
- 억만금을 줘도 가질 수 없는 아빠와의 행복한 추억
- 제4회 수원시체육회장배 생활체육 체조 경연대회 성황
- 밤밭문화센터 사진반, 용주사로 출사를 가다
- '피어나다, 천천데이' 5월 청소년의 달 맞아 열려
- 광교노인복지관, '함께해요! 해피데10!' 성황리 펼쳐
- "우리동네에 퍼진 따듯한 효심" 매탄2동 경로잔치 열려
- 수원시, 올해의 책 선포식… 시민들 함께 책 읽어요!
- [우만1동] "쓰레기 해결사 강반장이 떴다"로 쓰레기 현장 2차 토론회 진행
최신뉴스
- 상률초등학교, 사랑을 전하는 스승의날 행사 진행
- 황영웅 팬클럽 '파라다이스' 경기남부지역, 수원시에 성금 1000만 원 기부
- [화서1동] 청소년지도위원회,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민관협력회의 개최
- 이재준 수원시장, "탄소중립 실천한 기업 국가가 인증하는 'ESG 기후공헌 인증제'만들자"
- 수원 장안구보건소,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고혈압·당뇨병 건강교실
- 수원로컬푸드직매장에서 3만 원 이상 구매하면 5000원 상당 농산물 덤으로 드려요
- 수원시민은 '수원 시민안전보험' 꼭 기억하세요!
- 수원시, '새빛 생태교통+ 자동차 없는 날' 운영… '탄소중립 도시' 선도한다
- 2024년 상반기 수원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9개 기관에서 총 26명 선발
- SK청솔노인복지관, 황혼 육아 가정에 비타민 영양제 지원
 즐겨찾기 추가
즐겨찾기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