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
27년만에 중년이 된 제자들과 만났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추억, 자랑스러운 축복
2014-01-06 16:59:27최종 업데이트 : 2014-01-06 16:59:27 작성자 : 시민기자 윤재열
|
|
27년 만에 제자들에게 연락이 왔다. 기다리지 않았던 첫눈이 내리듯, 어쩌다 예고도 없이 날아온 한 장의 편지처럼 핸드폰이 울렸다. 보고 싶다는 내용이다. 섣달을 지척에 두고 저무는 해를 보고 있었는데 뜻밖에 반가운 소식이다.  27년만에 만난 제자들과 함께 그러나 교직 첫 걸음에서 만난 그들과의 추억은 달랐다. 기억의 저편에서 지워지지 않고 여전히 남아 있었다.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면서 걸었던 탓인지 쉽게 잊히지 않았다. 그 추억은 살아오면서 어려운 때를 만나면 가슴 한 구석에서 힘을 주었다. 그 추억의 실체를 이번에 다시 만났다. 중년이 된 아이들과 반백이 되어 버린 동료 선생님들을 모두 만났다. 반가웠다. 아이들은 기쁨에 큰절을 하고, 선생님을 눈물을 찍어대기도 했다. 사람들은 저만치 흘러가 버린 세월과 나이를 탄식하기도 한다. 그것이 젊음을 빼앗아버린 것이라고 원망한다. 그러나 세월은 인간이 소비하는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세월 속에 어린 고교생들은 중년의 어른들이 되어 있었다. 모두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했다. 그러고 보면 세월은 신이 인간에게 베푼 귀하고도 유일한 선물일 줄도 모른다. 녀석들은 나이를 먹었지만, 본래부터 지니고 있던 순수성과 맑은 모습은 그대로다. 청명한 지혜와 온화한 덕성을 보이고 건강한 몸까지 있어 모두가 훌륭하게 컸다. 경제적 여유를 이루지 못했지만, 아내와 일을 하며 부지런히 저축하여 내일을 꿈꾸는 녀석이 있다. 대기업에서 중견 간부로 일하는 친구도 있고, 저마다 자기 분야에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 특별한 분야에서 남다른 성취를 이뤄낸 친구도 있다. 남자들은 아버지로서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여자 아이들은 엄마로서 생활을 원만하게 다듬어가는 여유가 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박사학위까지 받아 후학을 가르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우리와 같이 교직의 길을 걷는 친구도 있다. 넉넉해 보이는 놈도 있지만, 조금 부족해 그것이 더 멋있는 놈들이다. 내가 훌쩍 커 버린 제자들에게 선생님으로 스승으로 대접을 받는 것이 송구하면서도 기쁘다. 지금은 어엿한 사회인으로 어깨를 펴고 있지만, 그들도 모두 실패와 좌절의 때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내일의 영광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노력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더욱 대견스럽고 자랑스럽다. 우리는 오랫동안 흩어져 있던 시간을 메우기 위해 따뜻한 정을 나누었다. 27년이란 세월이 적지 않은 긴 세월이었는지 때로는 격렬하게 기뻐하며 술잔을 기울였다. 이날 그들이 준 감동을 지금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새삼 어렵게 느껴진다. 아무리 고귀한 언어라도 그 기쁨을 그릴 수 없다. 혹 그때 어린 제자들에게 준 허물과 상처를 용서받고 이해받고도 싶어 했지만, 아이들은 아름다운 기억만 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누구나 가슴 속에 추억의 우물이 있다. 그리고 그 우물 속에 두레박질을 하면서 지난 간 시간에 대한 애무를 한다. 하지만 추억은 실체도 없이 언제나 홀로이다. 그런데 오늘 그 홀로인 실체를 함께 했던 제자들을 만나면서 생명력을 얻었다. 우리는 정지된 과거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뜨겁게 포옹을 했다. 우리들이 살아온 날들의 참모습에 찬사를 보내며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 인생을 살면서 추억의 실체를 만나는 것은 축복이 아닐까. 우리는 새해 첫머리에 축복의 잔을 높이 쳐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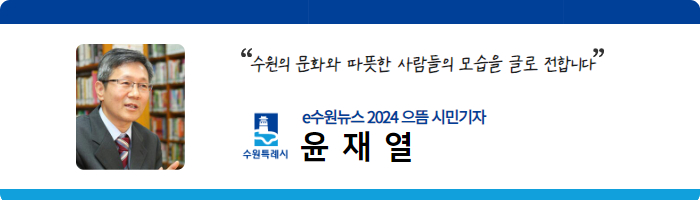 연관 뉴스
|
많이 본 뉴스
- 황영웅 팬클럽 '파라다이스' 경기남부지역, 수원시에 성금 1000만 원 기부
- 밤밭문화센터 사진반, 용주사로 출사를 가다
- 스승과 제자, 스승의 날 50여 년을 한결같이 만나다
- 2024년 상반기 수원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9개 기관에서 총 26명 선발
- 2024년 '청솔과 함께해孝' 지역 문화축제 개최
- 수원에서 30년 이어온 봉사활동... 이들이 있어 우리 사회 따뜻해
- 제4회 '수원시 체육회장배 족구대회' 개최
- 수원 가볼 만한 곳, 도심형 생태 수목원 영흥수목원
-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용주사 봉축식 봉행
- SK청솔노인복지관, SK마이크로웍스와 함께 '청솔과 함께해孝' 진행
최신뉴스
- 스타벅스 코리아 임직원, '화성행궁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 참여
- 2024년 함께 피우는 마을 꽃, 함께 봄, 나눠 봄 '우만 온마을 봄축제'
- [정자2동] 정2새마을문고, 문고 홍보 위해 광교산 산행 나서
- [우만1동] '아주대학교 사회봉사단' 연계 경로당 디지털 교육 진행
- [서둔동] 서둔동 주민자치회, 주민과 함께 '손바닥정원' 조성
- [금곡동] 악성민원 대비 경찰과 합동 모의훈련 실시
- 권선구, 잠자는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 추진
- 수원팔색길 걸으며 스탬프투어 즐기세요!
- '2024수원음식문화박람회' 부스 참가자 모집
- 수원시 1인 가구 청·장년이 요리 교실에서 만든 음식 장안구 홀몸어르신에게 전달한다
 즐겨찾기 추가
즐겨찾기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