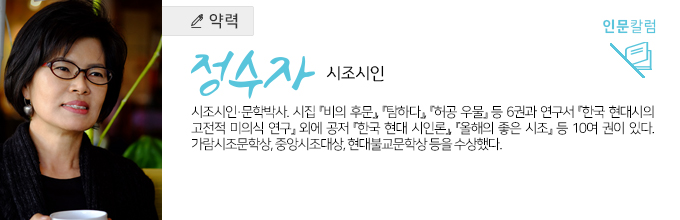본문영역
|
흙수저냐 물으면 끄덕일 밖에.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보다 자신을 흙수저로 치는 사람이 더 많을까. 계층 이동이 막히며 회자된 수저계급론은 불안한 현실의 초상이다. 그런데 팬데믹 후에는 격차가 더 벌어진다니 씁쓸하기 짝이 없다.
수저론은 집안의 위력을 여실히 보여준다. 성취라는 열매가 따르던 노력의 위엄과 가치는 사라졌는가. 출신에 따라 아파트 평수가 달라지는 현실에 지친 지도 오래다. 빈부 차가 커지면 조상 탓도 커지기 마련. 점점 커지고 깊어지는 격차가 자가발전의 유일한 동력인 의욕마저 무력화하는 중이다. 즐거워도 모자랄 판에 버겁기만 한 나날이 남은 힘마저 빼는 게다.
그럼에도 삶은 계속된다. 살면 또 살아진다고, 살아간다. 바닥에 떨어진 의지를 끌어 올려 발등에 떨어진 일을 해내는 것이다. 설 앞에서는 이런저런 삶의 무게를 더 느끼며 한숨 쉬는 소기리가 높아진다. 지금보다 없이 살던 예전에는 설날 모여서 차례 지내고 둘러앉아 떡국 먹으면 훈훈해졌다. 세배 드리고 소소한 세찬을 나누면 소박하나마 풍족한 느낌으로 새해를 열었다. 한참 전의 세시풍속이니 지금 시골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 시절의 제기 중에 놋그릇, 놋수저가 있었다. 설이나 추석이 다가오면 다락에 깊이 둔 놋그릇을 꺼내 공들여 닦고는 했다. 특히 기왓장 부순 가루가 반짝반짝 윤을 잘 냈다. 제기라서 숙연한 마음으로 숙여 닦은 기억이 있다. 제사에서 메와 탕국 등을 올린 후 젓가락을 굴러 고하는 소리는 지금도 생생하다. 놋저(箸)의 울림. 설날이면 쨍한 아침을 가르고 맑고 깊게 울리던 저 구르는 소리는 여운마저 경건했다.
놋제기는 은식기만큼이나 손이 많이 가는 그릇이다. 은식기는 소설 『레미제라블』에서 굶주린 장발잘이 훔쳤다가 평생 쫓기게 된 사연으로 안 잊히는 상징이다. 요즘은 영화나 뮤지컬로 유명하지만 세계문학을 교양 삼던 시절에 본 소설 속 은식기는 지금도 오롯하다. 부의 한 표상이자 그들만의 식기세트 이미지로 각인됐던 것. 그 후 은촛대나 은식기 등이 흰 냅킨과 함께 서양식 식탁의 미장센으로 많이 등장했지만, 한때는 상상 속의 장면일 뿐이었다.
그런데 시골집에서도 놋제기의 기억을 남겼으니 제사를 중시하던 시절 얘기다. 형편과 상관없이 제기를 장만했던 그때의 어머니들은 배워온 대로 제사의 예를 존중했던 것이다. 지금은 명절과 제사에 따른 불편부당과 과한 의무에 대한 문제제기가 여성 쪽에서 많이 나오지만 말이다. 가부장사회 곳곳에 잠복해있던 문제들이 명절 때면 자연스럽게 더 드러나고 터져 나오는 것이다.
그런 판임에도 저 구르는 소리는 그립다. 조금은 묵직한 놋저를 문득 굴러보고 싶다. 코로나 귀신이여 그만 물러가시라, 저를 굴러 아주 보내버리고 싶다. 퇴행적이라 웃어도 어린 날 보고 자란 고전 같은 제의 기억에 기대어. 그 후에는 어른들께 다니던 세배 길의 '뽀드득' 여운도 불러보고 싶다.
그렇듯 지구촌 어디서나 올리는 감사기도로 치면 설날 행사에서도 기운을 얻지 않을까. 따로 또 홀로 설을 보내는 중에도 마음의 절을 나눈다면. 그런 기억으로 놋수저 아닌 놋제기 하나 가꾼다. 가끔은 닦아보듯 명명(冥冥)한 울림에 마음을 비춰보며.
|
독자의견전체 0개
많이 본 뉴스
- [현장르포] "집수리 막막한가요? 새빛하우스 컨설팅 전문가가 찾아갑니다"
- 뭐라도학교, 유쾌한 8시간 워크숍
- "어르신들에게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이다"
- 수원 청개구리 기자단 오리엔테이션 성황리 개최
- 119년만에 돌아온 수원 화성행궁 우화관(于華館)과 별주(別廚)
- 꿈꾸는 기타리스트 정성하의 토크콘서트 !
- "고객 서비스는 머리로 하면 두통, 마음으로 하면 소통"
- 매주 토요일은 '재미샵' 가는 날, 플라스틱 모아 지역화폐로 교환해요!
- 서화, 수채화, 글쓰기로서 100세 장수 시대를 선도하는 명인
- 다채로운 끼와 재능을 가진 청소년들, 모여라!
 즐겨찾기 추가
즐겨찾기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