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
화성 8경 화산서애와 수원 8경 화산두견
화성연구회 모니터링, 융건릉 답사 다녀와
2025-04-03 13:57:46최종 업데이트 : 2025-04-03 13:57:44 작성자 : 시민기자 한정규
|

진달래꽃이 활짝 핀 융건릉 입구 화성연구회 4월 모니터링은 수원화성을 벗어나 화성시에 있는 융건릉과 용주사를 답사했다. 이곳은 오늘날 화성시에 있지만, 원래는 수원에 있었다. 역사 문화적으로 같은 뿌리였지만 인위적으로 수원과 화성으로 행정구역을 나누면서 이산가족이 된 듯한 문화유산이 되었다. 사도세자, 정조대왕, 수원화성은 핵심적인 정체성이 같기 때문에 서로 다르게 이해할 수 없다. 1762년 영조가 아들인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어 죽인 후 현재의 서울시 동대문구 배봉산 아래 수은묘에 묻었다. 1776년 정조가 왕위에 오르면서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무덤을 묘에서 원으로 격을 올리고 영우원으로 바꾸었다. 1789년 영우원을 현재의 융릉 자리로 옮겨 현륭원을 만들었다. 조선 왕실의 무덤은 신분에 따라 다르게 부른다. 왕과 왕비의 무덤은 능이라 하고, 왕의 부모나 왕세자와 왕세자빈의 무덤은 원, 왕족과 후궁, 폐위된 왕과 왕비의 무덤은 묘라고 부른다. 사도세자 사후에 신분이 바뀌면서 수은묘, 영우원, 현륭원, 융릉으로 명칭이 바뀌게 된 것이다. 
융건릉 소나무 숲 1897년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1대 황제가 된 고종은 직계 선왕들의 신분을 황제로 높였다. 사도세자도 왕으로 높여 장종으로 하고 현륭원은 융릉으로 높였다. 이후 장종을 황제로 높여 장조라고 했다. 융릉 오른쪽에는 정조와 효의황후의 능인 건릉이 있다. 조선의 왕과 왕비, 대한제국의 황제와 황후 73명의 무덤 전체를 조선왕릉이라 한다. 능은 42기가 있는데 북한에 있는 2기를 제외한 40기가 200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서울에 있던 영우원을 현재의 융릉 자리인 현륭원으로 옮길 때 이곳은 수원의 관아가 있던 중심지였다. 정조는 아버지의 묘를 옮기면서 수원의 관아를 현재 화성행궁 자리로 옮기고 향교도 옮겼다. 그곳에 살던 백성들도 이주시킨 이후 수원화성을 축성했다. 
융릉 융건릉 입구에 들어가니 미선나무꽃에서 진한 향기가 답사객을 맞이하고 진달래꽃이 활짝 피어 발걸음을 가볍게 했다. 역사문화관을 관람하고 융릉으로 향했다. 지난해 폭설로 인한 소나무의 피해가 눈에 들어왔다. 길가의 진달래꽃은 그때의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흐드러지게 피었다. 융릉과 건릉의 갈림길에서 수원 8경의 유래에 관해 설명했다. 정조대왕은 수원화성을 축성하고 1년 정도 지난 시점에 화성 춘 8경, 추 8경을 정하고 단원 김홍도에게 병풍으로 그리게 했다. 춘 8경 첫 번째가 '화산서애(化山瑞靄)'이다. 한글 정리의궤에는 화산서애에 대해 "화산의 상서로운 안개이다. 화산은 원소(현륭원)의 뒷산으로 산봉우리가 우뚝 서서 용과 봉황이 나니 좌우의 첩첩한 산봉우리와 사면에 벌여있는 봉우리가 다 길하고 상서로운 기운을 머금어 화산에 조회하는 형상이다. 날마다 상서로운 빛이 가득히 어리어 아침 햇빛이 붉은 안개가 되니 그 아래 만년의 구슬 언덕(현륭원)에 아름다운 기운이 함께 가득하여 우리 동방의 무강한 복록을 이 안개 일어나는 곳에서 가히 볼 수 있다. 이 어찌 채색과 먹으로 형용할 바이리오?"라고 설명해 놓았다. 
건릉 1912년 이원규가 채록해 매일신보에 소개한 수원 8경에는 화산서애가 화산두견(花山杜鵑)으로 바뀌었다. '화산두견이란, 화산 숲속 두견화(진달래꽃) 위에서 슬피 우는 두견새 소리'를 말한다. 용어가 약간 바뀌었지만, 융릉과 건릉이 있는 화산이란 공간적 배경은 변하지 않았다. 두견새는 뻐꾸기과의 여름 철새로 두우, 자규, 접동새 등으로 부르는데 흔하게 볼 수 있는 새가 아니다. 많은 사람이 올빼미과의 소쩍새와 혼동을 하는데 생김새와 울음소리가 전혀 다르다. 조선시대의 옛 시에도 두견새가 많이 등장하는데 대부분 소쩍새를 두견새로 오해한 경우가 많다. 두견화와 두견새 이야기를 마친 후 융릉과 건릉을 둘러보았다. 능 앞에서는 회원 모두가 국궁 4배 선창과 함께 예를 표했다. 융릉 앞 비각에는 '조선국 사도장헌세자 현륭원'이라 쓴 비석과 '대한 장조의황제 융릉 현경의황후 부좌'라고 쓴 비석이 있다. 건릉 앞 비각에는 '대한 정조선황제 건릉 효의선황후부좌'라고 쓴 비석이 한 개만 있다. 설명문에는 비석을 갈아서 다시 썼다고 하는데 의문이 든다. 
융건릉 비 융릉 주변은 온통 소나무만 있는데 건릉 주변에는 참나무만 있다. 궁금해서 여러 사람과 대화를 해보니 "융릉은 정조가 아버지를 위해 직접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정조의 철학이 담겨있고, 건릉은 순조의 철학이 담겨있어 이런 현상이 생긴 게 아닐까요?"라는 의견이다. 오늘날 수원시민 다수는 융건릉을 수원과 관계가 없는 문화유산으로 생각한다. 1,000년 이상 문화적 뿌리가 같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 현재의 지역이 다른 것과는 상관없이 수원화성, 융건릉, 정조대왕, 사도세자를 같은 역사 문화적 정체성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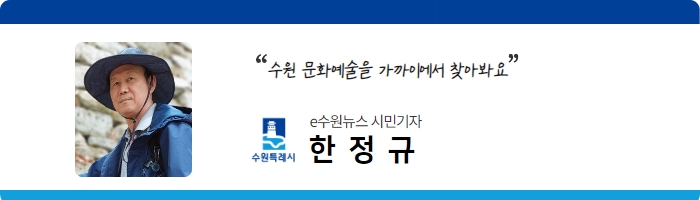
연관 뉴스
|
독자의견전체 0개
많이 본 뉴스
- '밤밭청개구리공원', 새봄 맞아 깨끗하고 안전하게 단장
- [고등동] 단체장협의회 및 주민자치회(교육복지분과), 영남 지역 산불 피해 복구 성금으로 200만원 기부
- '수원시 탑동시민농장'과 '문화 특화지역' 탐방
- 수원에 애국과 교육의 씨앗을 뿌린 독립운동가 임면수
- "곡선동 주민자치센터, 의견 모아 더욱 빛나는 프로그램 만들기!"
- 수원시 '새빛하우스' 올해도 관심 뜨거웠다…지난해보다 30% 증가한 2967호 신청
- 이제는 저속 노화 시대! 몸에 좋은 약선요리 즐겁게 배워보실래요?
- 새빛민원실 찾은 80세 어르신, "산불 피해 지역 도와달라" 10만 원 든 봉투 건네
- 현근택 수원시 제2부시장,주요 사업 공사·조성 잇달아 찾아 현장행정
- "배움에 나이란 없다" 만 94세 어르신도 끊이지 않는 학습 열정
최신뉴스
- 수원시, 광교산에서 지구살리기 플로깅 캠페인 추진
- 영통구, 2025년 상반기 통장자녀 장학증서 전달식 개최
- [화서2동] 주민자치회, '화사한 꽃 정원' 조성
- 이재준 수원시장, "민생 안정,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대응하라"
- [연무동] 주민자치회, '종이 없는 회의' 개최
- [서둔동] 샤론안경원의 통 큰 기부… 서둔동・구운동 취약계층에 안경·돋보기 100개 기부
- BWV140 코랄 칸타타와 함께 했던 지난 3일 연주회
- 세대가 함께한 특별한 시간, 수원시다함께돌봄센터13호점 꽃심기 행사 개최
- 골든에이지여성합창단 국제합창대회 출정식 갖고 선전 다짐
- 자라나고 싶은 마음, 삶의 소중함이 만들어 가는 흔적
 즐겨찾기 추가
즐겨찾기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