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화산 아래 현륭원이 조성되면서, 이곳에 있던 수원부는 팔달산 아래로 이전했다. 융건릉은 이야기가 참 많다. 묏자리를 잡을 때부터 시작됐다. 정조는 양주 배봉산(서울 동대문구)에 수은묘(사도세자 묘)가 늘 마음에 걸렸다. 즉위하자마자 영우원으로 격을 높였다. 그리고 무덤도 좋은 곳으로 옮기고 싶었다. 명당으로 알려진 화산 아래로 이장하고 원의 이름을 '현륭'이라고 고쳤다. 그러면서 화산 아래 수원부는 팔달산 아래로 이전했다. 그리고 몇 년 후 수원을 화성유수부로 승격했다. 현륭원이 이곳으로 오면서, 수원이라는 신도시가 생겼다. 융건릉 재실에 들어섰다. 재실은 능역이 시작되는 입구다. 이곳에서 몸가짐을 바로 하고 참배 준비했다. 재실은 채색이 없는 목재로 지어져 오랜 침묵을 머금고 있는 듯 낡았다. 정원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개비자나무가 있다. 눈길을 끌 만큼 요란스럽지는 않으면서도 부드러운 수관이 마음에 닿는다. 고요한 공간에 있으니 왕들의 기운이 어린다. 
건릉 가는 길에 나무. 나무가 하늘 높이 솟았다. 정조는 재위 기간 동안 나무를 많이 심었다. 재실을 나와 건릉 입구로 간다. 나무가 하늘 높이 솟았다. 숲을 이루고 있다. 참나무와 소나무 등이 모여 있다. 나무들이 저마다 의연하고 기품이 있다. 적당히 구부러진 몸매는 자연스러워 더 멋지다. 온갖 풍파를 견디며 살아온 나무들을 보는 순간 외경감이 든다. 정조는 '식목왕'이라 불릴 정도로 나무를 사랑했다. 재위 기간 조선 전역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나무를 심었다. 수원유수 서유린에게 현륭원 나무 심기를 명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 나무가 지금은 숲이 됐다. 요즘 왕릉에서 사람들은 참배보다는 가벼운 산책 등 쉼을 즐긴다. 능역에 조성된 숲이 경관도 좋지만, 도심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에 알맞다. 울창한 숲에 있으면 깊은 산속에 있는 느낌이다. 맑은 공기와 호흡하고, 청정한 자연을 보고 있으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다. 기후 위기에 미세 먼지까지 있는 시대에 자연환경이 소중한 공간으로 떠오른다. 그러고 보니 정조대왕은 미래 시대까지 내다보고 왕릉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든다. 
정조는 아버지에 대한 남다른 정리가 있어 현륭원 조성 등에 정성을 다했다. 나무숲을 지나 금천교가 나온다. 홍살문이 솟아 있고, 참도 끝에 정자각이 무심히 앉아 있다. 정자각 앞쪽이 넓다. 홍살문을 뒤에 두고 바라보니 마음이 시원하게 적셔온다.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은 산마루에 헌칠민틋한 나무들이 줄지어 있다. 여기선 하늘빛도 참 아름답다. 풍수를 모르는 사람이 봐도 명당처럼 보인다. 230년 전 그때(1795년 윤 2월 12)도 이렇게 아름다웠을까. 스물일곱에 남편을 잃고 무덤을 찾은 혜경궁 홍씨는 어땠을까. 자궁이 보여를 타고 산에 올랐는데, 임금께서 친히 자궁이 타신 보여를 떠받치면서 뒤를 따랐다. 정상에 올라가서는 임금께서 손으로 섬돌을 어루만지며 통곡하시며 눈물을 흘리니, 그 눈물이 섬돌 표면에 흘렀으며 감히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지 못하셨다. 잠시 후에 임금께서 천신들을 돌아보시고 자궁을 가마에 모시고 화성행궁으로 돌아가라고 했다. 
융릉은 수은묘에서 현륭원으로 마침내 융릉으로 조선 시대 왕실 무덤 분류를 다 이어왔다. 혜경궁 회갑연에 외빈으로 참석한 홍용한이 남긴 글(화성행행일기)이다. 능침이 비교적 높은 곳에 있다. 환갑을 맞은 혜경궁이 걸어서 올라가기는 힘든 언덕이다. 그래서 사초를 가마 타고 올랐다고 기록하고 있다. 임금이 통곡하시는 모습을 그렸는데, 혜경궁은 일찍 행궁으로 돌아가셨다고 썼다. 봉분 앞에 엎드려 혜경궁은 비통한 울음을 터뜨렸을 것이다. 어머니를 모시고 온 정조는 어느 때보다 아버지에 대한 슬픔이 쏟아졌다. 그 모습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메어온다. 정조는 아버지 능을 조성하면서, 전사청 짓는 문제, 석물 배치 등도 직접 관여했다. 특히 선대 임금 세조는 난간석과 병풍석 등 왕릉에 대한 치장을 간소화하라고 했지만, 정조는 남다른 정리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석물을 제대로 설치하였다. 이렇게 아버지 무덤을 왕릉급으로 조성한 것은 궁극적으로 왕으로 추대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건릉 정자각. 정조는 역사를 남기고, 수원을 남겼다. 지금은 이 능침공간에 올라갈 수가 없다. 출입을 금하고 있다. 사초 위로 보이는 능침공간은 웅장함을 느낄 수 있다. 정자각 뒤편에서 올려 보니 봉분을 지키는 석상도 조금 보인다. 석물을 자세히 볼 수 없지만, 격조 있는 조각상처럼 느껴진다. 정조는 수은묘의 승격과 천장을 통해 아버지 명예를 복권하고, 동시에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다. 동시에 신읍치의 설치와 수원 화성을 건설했다. 정조는 재임 기간 현륭원을 13차례 행차했다. 이후 순조부터 고종까지 현륭원과 건릉을 찾았다. 순종 황제도 융건릉을 참배했다. 이런 과정으로 수원은 조선 후기 정치 중심에 있었고, 오늘날 큰 도시로 성장했다. 융건릉은 단순히 왕과 왕비의 무덤이 아니다. 과거 역사가 숨 쉬고, 신도시를 남긴 이야기가 있다. 그 왕릉과 수원화성은 오늘날 나란히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시민과 여행객은 왕릉에서 여유를 찾고, 역사 도시에서 삶과 문화를 즐긴다. 둘은 현재진행형의 공간이고 점에서도 매력적이다. 과거와 미래가 지속해서 이어지는 곳, 여기는 수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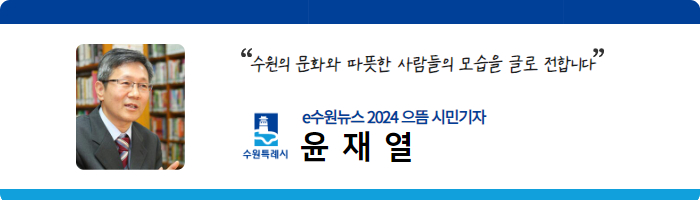 연관 뉴스
|
독자의견전체 0개
많이 본 뉴스
- 평생학습관에 만개한 아름다운 벚꽃 그리고 음악미학의 울림
- 칠보산에서 보물 찾고, 봄기운도 받고
- 수원노인봉사회, 창립 10주년 기념식 개최
- 수원 백성병원, 호스피스 전문 기관 지정 개소식 개최
-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 '학교 밖 꿈자람' 운영 학생 맞춤교육 실현
- 수원시, '멕시코·라틴아메리카 유네스코 학습도시연맹 콘퍼런스'에서 평생학습 등 우수사례 소개
- 경기도 예술가들의 새로운 협업 플랫폼, '경기아트콜렉티브 협동조합' 창립총회 개최
-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청소년 동아리 모집…활동비 지원
- 수원시 도서관에는 '골라 보는 재미'가 있다!
- 수원페이 1인당 보유한도, 5월 1일부터 100만 원으로 변경
최신뉴스
- [화서1동] 다사랑재가복지센터 방문해 '새빛돌봄서비스' 홍보 실시
- [매탄3동] 생계 위기 가구에 신속 지원 '긴급복지 지원 사업'
- [송죽동] 자립 준비 청년에 자립지원금 전달
- 수원 영통시민뮤지컬 '갈매기가 건져올린 소문'
- 걸으면서 치매를 극복하고 치매 파트너도 되어보자
- [조원2동] 학교 앞에서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활동 실시
- [화서1동] 이교수한정식 수원대게에서 '어르신 사랑의 생신상' 진행
- [세류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하는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장 담그기
- 화장실의 메카 수원시 팔달구! 수원시 웹사이트 통해 화장실 위치 안내 서비스 시작
- 인사담당자들을 위한 찾아가는 노동법 교육
 즐겨찾기 추가
즐겨찾기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