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
경기도서관 첫 전시회《깃털과 이끼》, 기후와 생명을 잇는 대화
12월 14일(일)까지 무료 관람, 그림책 원화로 만나는 생태의 이야기
2025-11-05 10:32:18최종 업데이트 : 2025-11-05 10:32:16 작성자 : 시민기자 안선영
|

'기후환경 특화 도서관'으로 문을 연 경기도서관, 자연과 함께 숨 쉬는 친환경 공간으로 거듭나다. 경기도서관은 지난달 문을 열며 '기후환경 특화 도서관'이라는 이름을 내걸었다. 태양광과 지열을 활용한 건축 구조, 벽면을 따라 이어진 스칸디아모스가 보여주듯 도서관의 철학은 분명했다. 인간과 자연이 함께 숨 쉬는 공간, 그 첫걸음은 지하 1층 전시실의 개관전 《깃털과 이끼》에서 시작된다. 이번 전시는 지난 7월 22일부터 10월 1일까지 경기도 내 8개 공공도서관을 돌며 열린 그림책 원화전의 확장판이다. 시흥 소래빛도서관을 시작으로 평택 비전도서관, 수원 일월도서관, 안양 큰샘어린이도서관, 성남 중원도서관, 동두천 꿈나무정보도서관, 남양주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파주 교하도서관을 거쳐 이제 경기도서관 전시홀로 자리를 옮겼다. 특별전 기간은 12월 14일(일)까지 누구나 무료 관람할 수 있다. 개관 첫 주에는 관람객이 많아 조용히 감상하기 어려웠기에, 제대로 보기 위해 다시 도서관을 찾았다. 
도시의 편리함 뒤에 숨은 생명의 이야기, 그림이 조용히 전하는 사라진 시간들. 경기도를 대표하는 도서관의 첫 전시가 '기후'를 주제로 열렸다는 점이 의미 깊다는 사실! 책이 지식을 넘어 생명의 대화로 확장되는 순간, 경기도서관은 그 자체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선언이 되리라. 첫 코너는 권정민 작가의 <지혜로운 멧돼지가 되기 위한 지침서>, 도시 개발로 숲을 잃은 멧돼지가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다. 멧돼지를 '침입자'가 아닌 '공존의 틈새'를 보여주는 존재로 그려냈다. 자연과 인간의 경계가 허물어질 때, 함께 살아갈 방법이 보인다는 메시지가 담겼다. 그 옆에는 <사라진 저녁>이 걸려 있다. "배달 음식의 시대, 우리가 잃은 것은 무엇일까?"라는 문장이 인쇄된 작품이다. 음식 대신 재료가 보내진 것. 그림 속 돼지는 사람의 집 앞까지 배달되어 온 존재였고, 그 장면은 편리함의 이면에 숨은 진실을 드러냈다. 우리가 편리함을 위해 소비한 것은 에너지뿐 아니라 다른 생명의 시간이다. 도시의 편리함 속에서 얼마나 많은 생명이 사라졌는지를 그림은 조용히 말하고 있다. 두 작품은 익숙한 도시 풍경을 낯설게 비춰주는 거울 같았다. 인간 중심의 시선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짜 생태의 풍경이 보이는 듯하다. 
거울이 걸린 전시 코너, 작품 감상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려는 관람객들로 줄이 이어진다. 전시장 한가운데에는 회색빛 도시 속 동물들의 모습을 담은 '이너 시티' 시리즈가 있다. 동물들이 두 발로 서서, 사람처럼 빽빽한 건물 사이를 걷는다. 그들의 표정에는 피로와 익숙함이 뒤섞여 있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오래 바라보니 그 모습이 곧 우리의 하루처럼 느껴졌달까? 도시의 풍경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 겹쳐 보였기 때문이다. 마지막 벽에는 그림 대신 거울이 걸려 있다. 그 아래에는 "도시 속 인간 역시 생태의 일부입니다."라는 문장이 적혀 있는데.... 그 말은, 우리가 만든 도시가 결코 인간만의 공간이 아니리라. 자동차와 건물, 콘크리트 속에서도 생명은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버티고 있다. 인간은 그 일부로서 함께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거울 앞에 서자, 작품이 아닌 내가 전시의 일부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다. 도시를 구성하는 한 존재로서의 나,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공간이 하나의 생태계라는 사실이 마음속에 자리했다. 그렇게 생각하니 회색빛 건물들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 도로 위의 나무 한 그루, 하늘을 나는 새 한 마리까지 새롭게 보인다. 도시는 숨을 쉬고 있었다. 우리들은 그 숨결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그밖에도 초청된 7명의 그림책 작가가 참여해, 각기 다른 시선으로 자연과 생명을 표현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색감이 따뜻하게 바뀌는 공간, 김선진 작가의 '버섯 소녀'이다. 버섯은 땅속에서 다른 식물의 뿌리를 이어주며 살아가는 존재이다. 안내문에는 "버섯은 사라진 숲의 마지막 목소리이며, 새로운 생명을 잇는 다리입니다." 짧은 문장인데, 그림을 보고 나면 그 의미가 또렷해진다. 버섯은 땅속의 이야기를 전하는 매개체였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은 그들의 연결 위에서 자라나고 있다. '농부 달력'은 절기를 따라 살아가는 농부의 하루를 기록한 작품이다. 비와 햇빛, 바람이 시간을 만드는 장면을 담고 있다. 도시의 속도와는 전혀 다른 리듬이다. 작품을 보고 있자, 나도 모르게 호흡이 느려졌다. 자연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기억을 품은 숲, 제주 사려니숲길 인근 '북받친밭'을 그린 김영화 작가의 작품. 마지막 방에서 만난 작품은 김영화 작가의 '북받친밭 이야기', 제주 4·3의 기억을 품은 숲을 그렸다. 벽에는 말린 꽃과 까마귀 조형물이 걸려 있었고, 바닥에는 발자국 모양의 장식이 이어져 있다. 그림과 현실이 이어지는 듯한 연출이다. 기억을 간직한 숲이라 작가의 문장을 읽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걸었다. 발밑의 발자국은 장식이 아니라 과거로 향하는 길처럼 느껴졌다. 숲이 기억을 품고 살아남았다는 사실은 예술이 할 수 있는 가장 진한 위로가 아닐까? 숲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보다 길고, 그 안에는 사라진 이들의 흔적이 존재하고 있다. 그걸 잊지 않게 만드는 힘이 예술의 역할이란 생각이 들었다. 
깃털과 이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이어가는 생명의 이야기. 전시를 모두 보고 나면 제목이 자연스레 이해된다. '깃털'은 사라진 생명의 흔적이고, '이끼'는 땅을 되살리는 시작이다. 하나는 바람을 타고 이동하며 새로운 생태를 만들고, 다른 하나는 자리를 지키며 생명을 이어간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살리는 존재이다. 큐레이터의 노트에는 "깃털은 사라진 것을 상상하게 만들고, 이끼는 보이지 않는 생명을 다시 보게 합니다."라는 문장이 있다. 이 전시가 환경의 문제를 넘어선 이야기라는 걸 깨달았다. '살아 있는 존재들이 함께 이어가는 시간'에 관한 전시였다. 거대한 경고 대신, 작고 느린 생명의 회복을 이야기한다. 그것이 《깃털과 이끼》가 가진 가장 큰 울림이었다. 
새로운 도서관의 첫 전시! 경기도서관에서 피어난 생태의 대화가 반갑다. 《깃털과 이끼》는 경기도서관의 시작을 알리는 첫 전시이다. 도서관이 환경과 생명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장소로 바뀌고 있다. 전시를 모두 보고 나오며 "이끼는 가장 낮은 곳에서 세상을 바꾼다."는 말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하는 생명들처럼 도서관의 첫 전시도 조용하지만 확실한 방향을 보여주고 있었다. 책에서 배운 지식이 전시로 이어지고, 전시가 다시 사유로 돌아오는 공간. 《깃털과 이끼》는 그렇게 경기도서관의 첫 페이지를 차분히 써 내려가고 있었다. 전시 기간은 12월 14일(일)까지 지하 1층 전시실에서 무료로 만날 수 있다. ◎ 《깃털과 이끼》 기본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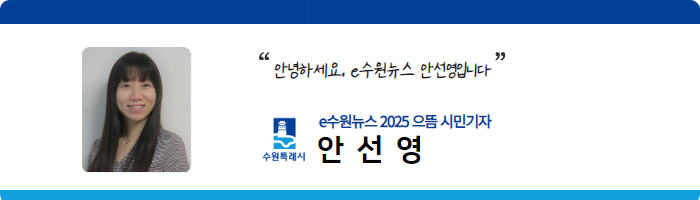
연관 뉴스
|
독자의견전체 0개
많이 본 뉴스
- '상큼한 봄을 한 입'…수원전통문화관 제철 요리 체험
- '2026 전통 장 만들기' 즐거운 체험의 장
- 서수원 의료 중심지 새 출발… 수원덕산병원 개원식 성황
- 수원시 아동 돌봄과 기업의 만남
- 경기시조 문학의 새 물결, 김경은 회장 시대 열리다
- 위급한 순간 시민이 생명을 살린다. 수원 '새빛안전지킴이 찾아가는 교육' 현장
- 서수원도서관 개관 20주년 의미 점검…세대가 함께하는 독서·문화 공간 자리매김
- 맑고 투명한 색으로 담은 자연과 삶의 울림
- 수원시향 기획연주회 '수원 음악인의 밤'…900석 가득 채운 클래식의 향연
- 수원특례시, 3월 '일자리 두드림 구인·구직의 날' 개최한다… 5개 업체 18명 채용
최신뉴스
- [평동] 주민자치회, 관내 경로당 8개소에서 노년층 대상 '푸드 테라피' 운영
- [조원1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원주공뉴타운 1,2단지 관리사무소와 업무협약 체결
- [매탄3동] 사례관리 가구 자립 위해 민관 전문가와 맞춤형 해법 모색
- '경로당 회계업무 척척' 권선구, 경로당 보조금 회계 정산 교육 진행
- [광교1동] 경로당·협의체, 함께하는'효(孝) 연결고리 프로젝트' 추진
- [매탄3동] 통장협의회, 3월 1차 정례회의 개최
- [율천동] 주민자치회, 2026년 제2의 밤나무 동산 정비 실시
- 나라꽃 무궁화, 수원특례시의회 광장에 새 뿌리 내리다
- [평동] 주민자치회, 2026 마을자치 리빙랩 사업 추진 위한 컨설팅 개최
- [평동] 2026년 새봄맞이 '우리동네 새빛 새단장' 일제대청소 실시
 즐겨찾기 추가
즐겨찾기 추가














